윤경희, 「빵집의 이름은 빵집」 중에서
- 작성일 2021-11-25
- 좋아요 0
- 댓글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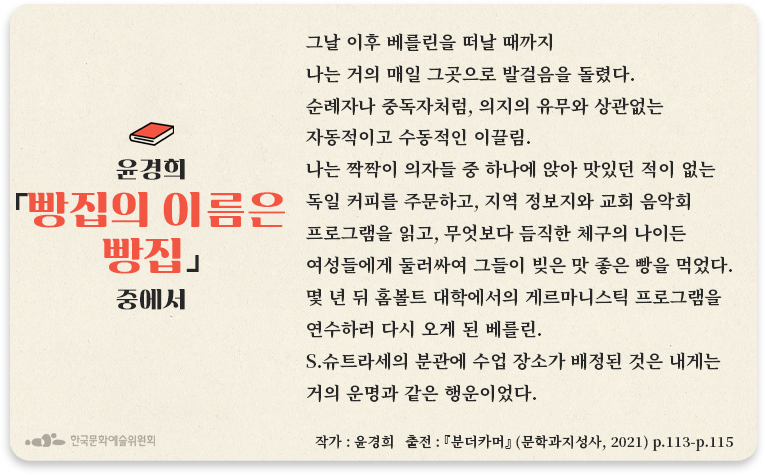
윤경희 ┃「빵집의 이름은 빵집」을 배달하며
이 글을 읽자니 제가 무척 좋아하는 빵집이 떠오릅니다. 인구 적은 소도시, 한적한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빵집인데, 그 가게의 이름도 ‘빵집’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숙소 근처라 우연히 가게에 들렀고, 먹어 보니 빵이 너무 맛있어서 머무는 동안 날마다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올 즈음에야 무심코 간판을 올려다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판 중앙에 크게 “빵집” 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어쩌면 세상의 작고 적요한 골목길에는 이름이 ‘빵집’인 근사한 빵집이 하나씩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리의 소음이 잦아든 모퉁이에서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로 사람들을 모으고, 빵의 재료나 생김새로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인상 좋은 주인이 막 오븐에서 따뜻한 김이 나는 빵을 꺼내놓는, 그런 빵집이요.
여행지에서 대개의 빵집은 산책을 하다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갓 구운 빵이 진열된 장식장이 보이거나 어디선가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나면 간판을 보지 않아도 빵집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빵’은 굳이 다른 이름을 지어 간판으로 붙일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자족적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빵의 이름을 죽 읊어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소설가 편혜영
작가 : 윤경희
출전 : 『분더카머』 (문학과지성사, 2021) p.113-p.115
책 소개 링크 : 문학과지성사 https://bit.ly/3bD56xA
추천 콘텐츠
도경이 사는 곳은 용희가 익히 경험해 본 장소였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의 자취방이 꼭 저랬다. 여름에 동기의 자취방은 주변에 햇빛을 가려 줄 만한 큰 건물이 없어 작은 냉장고에 몸을 쑤셔 넣고 싶은 집으로 탈바꿈했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는 동면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뼈 시리도록 반성케 하는 집으로 변모했다. 도경의 집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가림막 하나 없는 여름 한낮의 옥탑방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도 무방했다.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상쾌한 가을밤이 내려앉았을 때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캔 맥주가 손에 들려 있으면 더 좋았다. 용희는 옥탑방을 바라보며 마른침을 삼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도경에게 캔 맥주 한 박스를 몰래 사다 주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용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언덕길을 내려다보았다. 도경이 검은 봉지와 막대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서 자신이 있는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도경이 용희를 알아보는 데 쓰인 10초는 용희에게 머나먼 북극의 바다를 두어 번 갔다 오는 시간만큼 길게 느껴졌다. 당황한 용희는 마찬가지로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도경을 향해 소리쳤다. “제가 지구에 커튼을 쳐 드릴게요!” 도경은 입을 벌린 채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용희는 도경의 집 옥상에 놓인 평상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살며시 눈을 감았다. 지난 5년간 얼핏얼핏 그려 왔던 일이, 지난 이틀간 문득문득 상상했던 순간이 눈앞에 당도했다는 기쁨에 용희는 이마에서 얼굴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땀방울도 잊은 채 자신의 심장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에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그 역시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 날뛰는 소리는 아니었다. 용희는 심장이 악보 없는 음악에 홀려 무작위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처음으로 천문대를 찾았을 때 광활한 우주를 탐사하며 느꼈었던, 거대하고 두려운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예측불가능한 불안함 속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몸을 떨던 때의 심장 소리였다. 그때, 도경이 옥탑방에서 나와 유리컵 두 개와 감자칩을 담은 그릇을 평상에 내려놓았다. 도경은 평상에 편하게 앉더니 검은 봉지에 든 맥주 세 병을 꺼냈다. “병맥주 한 병을 마셨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제 제 주량이에요. 더 마시면 정신 줄 놔요.” 용희는 물었다. 그런데 왜 세 병을 샀느냐고. “술이 술을 부르니까.” 용희는 빙긋 웃었다. 도경은 용희의 컵에 맥주를 따른 후 자신의 컵을 스스로 채웠다. 건배 없이 도경이 먼저 맥주를 들이켰다. 용희도 마셨다. 도경이 말했다.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r
- 관리자
- 2024-09-26
나는 수미를 만나러 갔다. 오로라와 나비가 생긴 발로 내가 만나러 간 사람은 2031년의 수미는 아니고 2022년의 수미였다. 2022년이 막 시작된 겨울에 수미가 내게 어떤 협곡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수미가 일러준 협곡 입구로 가서 표를 끊었다. 그곳은 남한 최북단 마을에 있는 곳이었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서자 까마득한 암반 절벽 위로 길이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을 천천히 걸어서 나오면 자신이 일이 끝나는 시간대와 얼추 맞을 거라고 수미가 말했다. 나는 주상절리의 무늬들을 건너다보면서 절벽에 긴 선반처럼 매달려 있는 길을 걸었다. 벼랑길 밑으로 하얗게 언 강이 이어졌고 그 위를 사람들이 일렬로 걷고 있었다. 강 위를 걷던 사람들이 가끔씩 멈춰 서서 이쪽 벼랑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보였다. 절벽 위를 한 시간 남짓 걷고 나서야 나는 넓은 공원이 보이는 곳으로 나갈 수 있었다. 공원 한쪽에 빨갛고 기다란 버스가 한 대 서 있었다. 방한 아웃도어를 입은 사람들의 줄 끝에 서 있다가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 운전기사의 바로 뒷좌석에 앉고 싶었지만 누군가 이미 앉아 있어 대각선 쪽 좌석에 가서 앉았다. 버스가 몇 개의 정거장을 거치며 협곡 탐방객들을 내리고 태우는 동안 나는 룸미러로 버스 기사와 눈이 자주 마주쳤다. 그때마다 웃음을 참느라 마스크를 더 올려 써야 했다. 구독자가 2,01만명인 한 여행 유튜브 채널에 수미가 ‘친절한 기사님’으로 소개된 것이 떠올랐던 것이다. 과연 수미는 버스가 설 때마다 승객들과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고 트레킹 코스가 엉켜 헤매는 사람들한테 막힘없이 대안을 얘기해주었다. 버스는 몇 정거장을 더 거쳐 내가 표를 끊었던 협곡 입구로 왔다. “끝났다, 일.” 그렇게 말하고 수미는 나를 강으로 데리고 갔다. 절벽 위는 걸었을 테니 얼음 위를 걷자고 하면서. 나는 수미를 따라 강으로 내려갔고 우리는 금세 얼음 트레킹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등산화에 아이젠을 착용한 사람들 틈에서 운동화를 신은 건 수미와 나뿐이었으므로 우리는 또 금세 대열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걷다보니 어느새 폭이 좁아지는 협곡에 다다라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걸음을 멈췄다. 양옆으로 현무암 절벽이 가파르게 서 있어 마치 하늘이 보이는 동굴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수미와 나는 눈이 희끗희끗하게 덮인 얼음 위를 걸어서 암벽 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나오며 좁은 협곡 안을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운동화를 벗었고, 곧이어 양말도 벗었다. 맨발인 채로 얼음 위로 올라서자마자였다. 수미와 나는 뜨거운 불을 딛고 선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양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다 신발을 벗어놓은 바위 위로 뛰어올라갔다. 참을성이 조금도 없는 서로가 웃겨서 한참을 웃다가 다시 맨발로 얼음 위를 디뎠고, 몇 걸음을 걷다가 또 비명을 지르며 언 강과 바위를 뛰어다녔다. 그러다 우리는 누가 더 오래 서 있는지 내기라도 하듯 얼음 위에 맨발을 고정하고 섰다. 일초가 지나고 이초가 지나
- 관리자
- 2024-08-22
이제 목화에게 그분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알 필요가 없다. 우주에 마음이 있는가? 그저 존재할 뿐이다. 목화는 선하면서 악한 사람을, 의롭고도 불의한 이를,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동안 목화는 줄곧 나무에게 질문했다. 대답은 없었다. 목화는 나무를 느꼈다. 나무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시를 바랐다. 그 나무는 어디에 있는가? 목화는 나무를 찾으려고 했다. 없애고 싶었다. 나무를 없애면 온전한 자기 의지로 자기만의 삶을 살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무는 정말 나무로서 존재하는가? 목화는 그 나무가 자기 숨통을 쥐었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구할 때도, 구토에 시달릴 때도 자기 수명이 줄어드는 것만 같았다. 스스로 사람을 구하는 순간에도 나무의 명령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 나무는 대체 무엇인가? 나무에게 집중할수록 나무의 의미는 비대해졌다. 나무에게 호소할수록 나무의 힘은 강해졌다. 목화의 질문과 호소에 개의치 않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안도하거나 상관없이, 악하든 선하든 관심 없이 나무는 영원히 거기 있다. 그 나무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존재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나타났다가 멸종했고 진화했으나 도살되었다. 돌로 만든 무기로 동물을 사냥하고 무리 지어 이동하며 빠른 소도로 다른 생물을 몰살시키던 인류는 순식간에 핵폭탄과 우주선을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학살하고 자연을 파괴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면 과연 인류라는 종을 돕고 싶을까. 살리고 싶을까. 나무가 주는 생명은 은총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이라는 고통을 주려는 것인지도. 그러나 삶은 고통이자 환희. 인류가 폭우라면 한 사람은 빗방울, 폭설의 눈송이, 해변의 모래알. 아무도 눈이나 비라고 부르지 않는 단 하나의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것은 금세 마르거나 녹아버린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어쩌면 그저 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명체라는 전체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다고. 죽음을 바라보는 일을 거부하고 싶었다. 사람을 구하고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에 피하고 싶었다. 구한 자가 악인 같을 때는 마치 한통속인 것처럼 괴로웠다. 중개 때문에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 목화를 지배하는 것은 나무였다. 나무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구한 사람들처럼 단 한 명인 목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오직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신목화는 임천자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며 마침내 운명을 수긍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 목화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상, 온전히 자기 것으로 거둔 이상 이제 그것은 목화의 것이었다. 임천자의 단 한 명은 기적. 장미수의 단 한 명은 겨우. 신목화의 단 한 명은,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내가 원하는 삶. 목화는 생각했다. 그건 바로 지금의 삶. 목화는 원하는 삶 속에 있었다. 다시, 목화는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죽음. 임천자가
- 관리자
- 2024-07-25
저번까지 읽은 이후로 이어보시겠어요?
선택하신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