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옛일」
- 작성일 2018-02-01
- 좋아요 0
- 댓글수 37
- 조회수 9,926
[caption id="attachment_273042" align="alignnone" width="640" class="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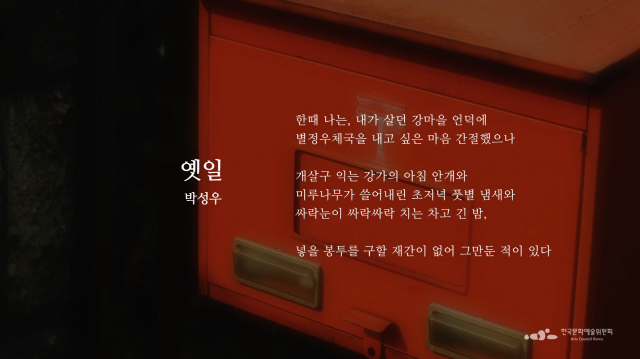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captio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caption]
작품 출처 : 박성우 시집, 『자두나무 정류장』, 창비, 2011.
박성우 |「옛일」을 배달하며…
오래전 소중한 이에게서 받은 편지처럼 쓸쓸하고 적막할 때 꺼내보면 힘이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편지와 시만 그런가요. 품었던 소망도 그런 것 같아요. 이룰 수는 없었으나 그 옛날 내가 그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졌었다는 기억만으로도 오늘을 새롭게 살아 볼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성우 시인이 문학집배원을 시작하며 첫인사로 이 시를 인용했었거든요. 이젠 옛일이 되었지만 좋은 옛일이라면 자주 떠올리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는 저의 일도 한참 뒤에는 옛일이 되겠지요. 제가 전하는 시들이 강가의 아침 안개처럼 부드럽고, 초저녁 별처럼 조심스레 환하고, 싸락눈처럼 고요해서 자꾸 떠올리고 싶은 옛일이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시인 진은영
|
||||
저번까지 읽은 이후로 이어보시겠어요?
선택하신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37건
나는 한때 수채화 물감을 붓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물레를 차고 흙을 빚어 가마에 불을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얀종이에 삭삭삭 연필 긋는 소리는 우리의 웃음소리 물통에 찰랑찰랑 착착 붓을 흔드는 소리는 우리의 고민소리 줄리앙은 알았을까? 내가 얼마나 잘 그리고 싶었는지.. 갑자기 던져진 컵이 깨져 공기가 놀라 조용하다. 이젤이 발로 차여 그림이 누워버렸다. 4시간마다 비난속에서 하얀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눈물이 그림을 그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연필을 깎으러가는 발걸음 조차도 조심스러웠다. 몸이 딱딱하게 석고상이 되어버렸다. 내 아픈 기억 속 공기와 너무나 닮아 있어 나는 견뎌낼 재간이 없어 그만 둔 적이 있다. 실패라고 생각했으나 나를 지킨것이라고. 이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다. 종이가 춤을 추고 물감이 시끄럽게 떠든다. 이제 나는 그림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인형을 만드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빠알간 우체통을 좋아하였다. 그래서인지 시보다 먼저 이 시의 배경사진에 빠알간 우체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시와 함께 내게 다가온 애틋함... 시인의 옛일이 애틋하였고 나의 옛일이 또 애틋하였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고 안타까워 마음 시렸던 나의 옛일... 어쩌면 옛일이기에 더욱 애틋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 시와 여러 번 만나면서 강가의 아침 안개에 스미어 있는 새벽향기가, 미루나무가지로 쓸어내린 듯 까아만 밤하늘에 흩뿌려진 은하수가, 고요한 밤 싸락싸락 내리는 눈 소리가 내게 다가오는 듯하여, 시인이 살던 강마을이 어딘가에 있는 것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리고... 오래 전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한 영화가 생각났다. il postino(시인 네루다와 우편배달부 마리오의 이야기). 시보다 먼저 문학집배원·시배달이라는 단어를 만나서, 시를 읽기도 전에 우체통을 보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오감으로 느껴서, 우연인 듯 필연처럼 내 기억에 그 영화가 소환되었다. 이 시를 읽고 나처럼 엉뚱하게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떠올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전달하지 못할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혹시 전달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아침 안개와 풋별 냄새, 싸락싸락 치는 소리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뿌연 풍경과 온몸에 물이 달라붙듯 촉촉한 느낌, 초저녁 공기에서 느껴지는 냄새, 눈이 내린다는 것을 가만히 인식하고 있는 듯 들려오는 소리까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은 가만히 풍경 속에서 고민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 사이 아침은 저녁이 되고, 눈이 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밤이 되며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넣을 봉투를 구할 재간이 없었다는 대목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을 전달할 용기가 없어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봉투에 들어가지도 못한 편지가 연상되어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시를 읽으며 언젠가 그 봉투에 넣을 편지가 우체국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예전에 나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했으며,꿈꾸었던가.. 지금의 나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도 감사를 모른채 끝없이 또 다른 것을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가.. 개살구 익는 아침 안개, 초저녁 풋별냄새,싸락눈 내리는 긴밤 과 같이 어쩌면 일상에서 흔할 수 있지만 그 위대한 자연을 담을 봉투가 없다고 그 우주를 담을 이는 흔하지 않다고 시인은 겸손한 마음을 낸지도 모르겠다. 사실로도 우리는 이기심과 자연을 막 대한 인연과보로 그 투명한 것들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지 못해 현재의 만족을 모르고 칭얼대는 내게 시인은 겸허한 손길을 내미는 듯 하다. 이제 그만 울고 서 있는 땅을 느끼고 하늘과 바람의 품을 맞으라고..
별정우체국은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통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민간이 우체국을 설립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 설명을 읽고 행정이 닿지 않는, 시에서 나오는 “강마을 언덕”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먼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안부를 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주고받는 모습이 떠올랐다. 강마을 언덕의 사람들은 개살구와 미루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침 안개를 맞고 초저녁 풋별 냄새를 맡으며 싸락눈 쌓이는 밤을 벗 삼아 그들과 대화하고 마음을 섞으며 살고 있으리라. 눈 쌓이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다 보면 내 눈 앞에 펼쳐진 장면과 내 안에 녹아든 풍경, 또는 풍경만큼 한없이 커진 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나의 언어나 표현력은 매우 졸렬해서 이내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식어버린다. 그 거대한 감각을 손에 잡아 봉투에 넣다 보면 아침 안개가 걷히고 초저녁 풋별의 냄새는 잠깐 내 코에 머물다 갈 뿐이며, 싸락눈은 녹아버릴지도 모른다, 풍경이 나인지, 내가 풍경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느껴지던 황홀한 일체감도 내가 그것을 의식의 층에 올려놓으려고 펜을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끊어지고 만다. 시간과 흘러가는 공기와 찰나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사로잡아 전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넣을 봉투를 구할 재간이 없”다는 시인의 마지막 한 줄이 나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시인은 별정우체국을 내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했지만 시를 통해서 강마을 언덕에서의 옛일이 시인과 전혀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 이보다 더 제대로 구실을 하는 별정우체국이 어디에 있을까. 시인은 이미 자신이 내면에 지은 강마을 언덕의 별정우체국에서 끊임없이 마음과 감각을 배달하는 것으로 그만둔 옛일을 지금의 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시에서는 “그만 둔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간절히 품었던 마음을 묵직하게 실천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마주하니 아련하게 부럽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