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중의「판」을 배달하며
- 작성일 2023-05-11
- 좋아요 0
- 댓글수 0
- 조회수 2,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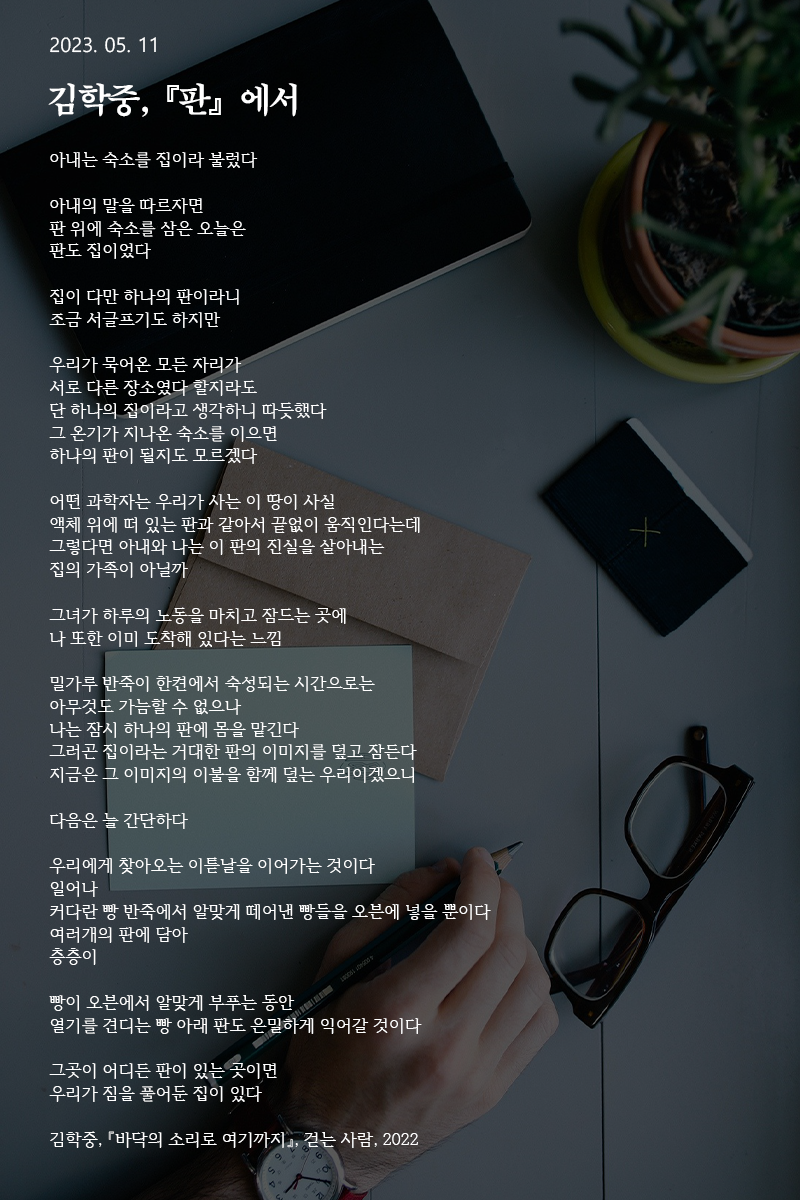
판
아내는 숙소를 집이라 불렀다
아내의 말을 따르자면
판 위에 숙소를 삼은 오늘은
판도 집이었다
집이 다만 하나의 판이라니
조금 서글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묵어온 모든 자리가
서로 다른 장소였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 따듯했다
그 온기가 지나온 숙소를 이으면
하나의 판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
액체 위에 떠 있는 판과 같아서 끝없이 움직인다는데
그렇다면 아내와 나는 이 판의 진실을 살아내는
집의 가족이 아닐까
그녀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잠드는 곳에
나 또한 이미 도착해 있다는 느낌
밀가루 반죽이 한켠에서 숙성되는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으나
나는 잠시 하나의 판에 몸을 맡긴다
그러곤 집이라는 거대한 판의 이미지를 덮고 잠든다
지금은 그 이미지의 이불을 함께 덮는 우리이겠으니
다음은 늘 간단하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튿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어나
커다란 빵 반죽에서 알맞게 떼어낸 빵들을 오븐에 넣을 뿐이다
여러개의 판에 담아
층층이
빵이 오븐에서 알맞게 부푸는 동안
열기를 견디는 빵 아래 판도 은밀하게 익어갈 것이다
그곳이 어디든 판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짐을 풀어둔 집이 있다
추천 콘텐츠
론리 푸드 식초에 절인 고추 한입 크기로 뱉어낸 사과 그림자를 매단 나뭇가지 외투에 묻은 사소함 고개를 돌리면 한낮의 외로움이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니까 천천히 먹기로 한다 밤이 되면 내가 먹은 것들이 쏟아져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낸다 식초 안에 벗어놓은 얼굴 입가에 묻은 흰 날개 자국 부스러기로 돌아다니는 무구함과 소보로 무구함과 소보로 나는 식탁에 앉아 혼자라는 습관을 겪는다 의자를 옮기며 제자리를 잃는다 여기가 어디인지 대답할 수 없다 나는 가끔 미래에 있다 놀라지 않기 위해 할 말을 꼭꼭 씹어 먹기로 한다 임지은, 『무구함과 소보로』, 문학과지성사, 2019
- 최고관리자
- 2023-05-25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 웅크린 채 몸을 말고 있다 보면 부풀 수 있대. 속이 꽉 찬 소시민이 될 수 있고 위기마다 일어설 수도 있대. 식빵과 나란히 누워 일광욕을 하고 싶어. 네모를 유지해 가며 메모하고 싶고 찢고 싶고 책 안 읽어도 꾸준히 한 장씩 식빵만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대. 뜯을 때보다 뜯길 때가 더 마음 편한 거래. 햇볕에 부푼 낙타 등을 어루만지며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 낙타보다 식빵보다 내가 먼저 무너져 걱정이긴 하지만, 심언주, 『처음인 양』, 문학동네, 2022 - 심언주┃「식빵을 기다리는 동안」을 배달하며 식빵을 기다리며 식빵에 대해 생각한다. 식빵은 부풀어 오르고 네모 모양이다. 나도 식빵과 같은 삶이고 싶다. 식빵처럼 부풀어 올라 “속이 꽉 찬 소시민이 될 수 있고/위기마다 일어설 수도 있”으면 좋겠다. 또 식빵처럼 “네모를 유지해가며/메모하고 싶”다. 가볍고 탄성 있고 그러면서도 네모진 각을 유지하고 있는 식빵의 생생한 물성이 그려진다. 눅눅한 인간의 일상을 날려버리고 싶을 때 식빵이 옆에 있다. “식빵과 나란히 누워/일광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 나는 이렇게 식빵에 의지하고 식빵을 붙잡는다. 왜 나는 항상 무너지고 위기가 올까. 왜 “낙타보다 식빵보다/내가 먼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식빵처럼 낙타처럼 주변의 사물들은 변함없고 평안해 보이는데 말이다. 시인 이수명 작가 : 심언주 출전 : 『처음인 양』 (문학동네, 2022)
- 최고관리자
- 2023-04-27
파란 코끼리 그는 걸었다. 그는 방금 국민은행을 지나쳤고, 국민은행을 지나 이바돔감자탕을 지나 지하로 통하는 술집을 지나 족발보쌈집을 지나 걸었다. 그는 걸었는데, 건물 2층 코인노래방을 지났고 스시정을 지나 베스킨라벤스를 지나 던킨도너츠를 지나 하나은행을 지났고 기업은행을 지나 걸었다. 그러니까 그는 꽤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계속 걸었다. 소울키친을 지나 커피빈을 지나 카페B를 지나 그 긴 코로 눈을 비비고 있는 파란 코끼리를 지나 주민 센터를 지나 무아국수……가 보이는 곳에서 그는 멈췄다. 긴 코로 눈을 비비고 있는 파란 코끼리라고? 그는 무아국수에서 등을 돌려 주민 센터를 지나 다시 코로 눈을 비비고 있는 파란 코끼리에게로 돌아왔다. 그 파란 코끼리는 분명 카페B와 주민 센터 사이에서 코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는 파란 코끼리가 코로 눈을 비비는 것을 지켜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이 긴 코로 눈을 비비는 파란 코끼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걸었다. 긴 코로 눈을 비비고 있는 파란 코끼리를 지나 주민 센터를 지나 무아국수를 지나 무등산갈비를 지나 천가게를 지나…… 강보원, 『완벽한 개업 축하시』, 민음사, 2021 - 강보원┃「파란 코끼리」를 배달하며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거리다. 은행이나 음식점, 술집, 카페가 늘어서 있는 거리를 거의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걸어간다. 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다. “소울키친을 지나 커피빈을 지나 카페B를 지나 그 긴 코로 눈을 비비고 있는 파란 코끼리를 지나 주민 센터를 지나”다가 문득 자신이 파란 코끼리를 보았다는 생각에 가던 길을 되돌려 코끼리에게 돌아온다. 번화한 거리에 나열되어 있는 상호명들 속에서 코끼리는 무엇인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거울이나 유리에 반사된 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로고나 스티커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앞에 멈추어 선 것이다. 표지와 로고로 가득한 무표정한 거리에서 이 잠깐의 정지는 의아하다. 그 자신도 예기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가던 길을 간다. “파란 코끼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를 멈추게 하는 파란 코끼리의 순간은 이렇게 거리의 평등한 무의미 속으로 멀어져 간다. 시인 이수명 작가 : 강보원 출전 : 『완벽한 개업 축하시』 (민음사, 2021)
- 최고관리자
- 2023-04-13
저번까지 읽은 이후로 이어보시겠어요?
선택하신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0건